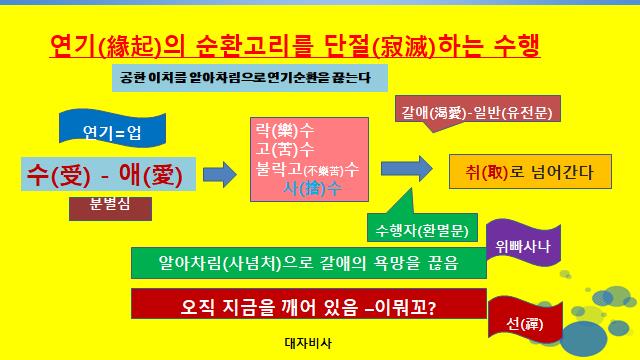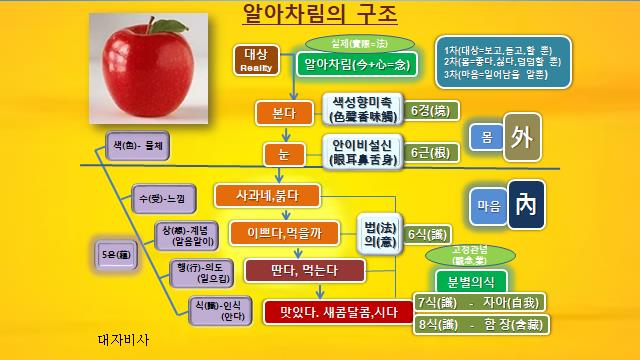39. 우리말 반야심경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1 범어 : बोधिसत्त्वः प्रज्ञासिद्धतेपारमिता Bodhisattvanam prajñā-pāramitām 보디 싸뜨와스남 프라즌냐-파라미탐 영어 : the Bodhisattva follows the Perfection of Wisdom 한문 : 菩提薩埵 依般若波羅蜜多故 한글 :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우리말 :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순우리말 :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참 진리의 깨달음에 의지하므로 보살(菩薩)은 범어 보디사트바(bodhisattva)를 음역한 보리살타(菩提薩埵)의 준말이다. 범어 보디(bodhi: 보리)는 깨닫는다는 뜻이며 시트바(sattva)는 존재, 중생, 유정(有情)을 뜻한다. 즉 보리살타는 깨달은 ..